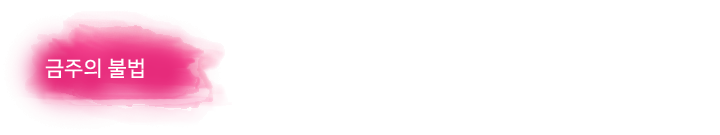콜레라에 걸린 첫돌된 아기의 생명의 빛(1)
하루에도 몇번씩 아기는 싸고 토하고 밤새울고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든 상활이였다.
몇날 며칠을 그렇게도 토하고 싸니 아이는 지칠대로 지쳐서 탈진상태가 되고, 나의 몸은 지칠대로 지쳤다.
죄받을 소리지만 저렇게 살기가 힘들면 아이가 잘못되였으면 할 정도로 지쳐있었다.
오죽이나 보기에 안타깝고 가슴이 메어지면 그런 무서운 생각을 다 하였을까?
이제는 탈진한 아기는 울움소리 조차 내지를 못하고 허여 멀건한 눈동자에 맥이 풀린 상태였다.
숨만 안쉬면 바로 송장인 그런 모습이 나의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놓았다.
물론 병원은 매일 매일 열심히 다녔으나 왠일인지 설사도 멈추지 않고 토하는것도 차도가 전혀없다.
마침내 아이는 눈조차 감아버리고 뼈만 앙상한 채로 갈비뼈가 다보이면서 배만불룩거리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당장이라도 숨을 거둘것 같았다.
나는 무섭고도 두려웠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 앞길이 캄캄하였다.
하루는 아이를 윗목에 담요를 덮어 씌운채 밀어놓았다.
자포자기한 심정이였다. 이젠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 차라리 죽으면 저 고통스러운 헐떡거리는 소리는 듣지 않을게 아닌가? 수없이 아이를 부둥켜안고 울었다.
나 역시 밥한끼를 제대로 먹지 못했다.
아이가 아파서 정신이없는데 어찌 입에 밥풀이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
그때는 어디에도 의지할때가 있음도 아니였다.
종교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지금도 잊지못하는 것은 너무나 무지하고 힘이 없다는 것이였다.
나이가 너무나 어린탓이였으리라!
다만 나는 아이들 고모가 시집을 가서 갓 새 색씨때 아이 하나를 낳아 놓고 죽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나서 항상 마음속으로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며 마음속을 빌었던 생각은 난다.
음력4월이면 그 고모의 제사날이라 하여 나름대로 밥 한그릇이라도 형식상이지만 웃목에 떠놓기는 하였었다.
나이도 어리고 철도 없었으나 아마도 그렇게 하라고 시킨듯하였다.
물론 뭔가를 알고 함이 아니고 아마도 지금의 기도생활의 인연의 끈이 아니였을까?
아이가 아프기 몇년 전에 아주 우연히 금호동 극장옆 민가에 절이 있기에 아이를 업고 들었갔더니 너무나 초라하고 다시뒤돌아 나오고 싶을 정도로 지저분한 곳이였다.
아이를 업고 젊은 새댁이들어오니 머리를 기른 아주머니가 힐끗하고 쳐다 보더니 아는체도 않았다.
아마도 어린아이를 등에엎고들어온 젊은 새댁이 그리도 초라한 모습이 였을까?
아니면 나이가 너무나 젊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라 생각하였을 것이다.
아는체도 안하고 자기 일을 보는 가운데 나는 무척이나 겸연쩍고 부끄러워서 황급히 뒤돌아나오려하니까
어디선가”지장보살! 지장보살!”하는소리가 들렸다.
일을 하시면서 아주머니가 외우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부르는 듯 하였다.
밖으로 나오려든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멈추었다.
“지장보살!”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나는대로 발길을 돌려서 가만히 소리나는 곳을 향하여 발을 움직였다.
소리나는 방은 한쪽 뒤켠에 있었으며 퀘퀘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무척이나 청소를 한번도 하지 않은 듯 더럽고 지저분한작은방에 나이드신 남자 어른이 누워서 입으로 “지장보살!” 을 외우고 있었다.
나는 너무나 놀래 잰걸음으로 그 집을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몇년이 지난 지금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지장보살!’ 이라는 소리가 귓가에 쟁쟁하였다.
그 남자분의 목소리! 비굴하면서도 세상을 다 포기 한듯한 목소리!
왜? 자구만 나의 귓가에 맴돌을까?
아이가 사경을 헤메이고 있는 이때 그 때의 소리 ‘지장보살!’이라는 말이 수없는 세월동안 들어 왔던 귀절인듯하였다.
‘지장보살!’ 나는 그때 아하! 아픈사람이 부르면 좋은 말인가? 보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처음으로 “지장보살!”하고 외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초라하고 병든 모습의 그 남자가 부르던 소리를 나도 모르게 점점 소리가 입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두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렀다.
“지장 보살님이이셔! 우리 아이를 살여주십시요!” 하고 소리내서 엉엉 울었다.
사람인지 귀신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저 불렀다 한참을 울면서 지장보살을 부르고 있는데 웃 목에 죽으라고 밀어 놓은 아기의 담요가 풀석거리는 듯 하였다.
나는 무릎으로 기어서 아이의 담요를 들치고 아이를 감싸 안았다.
아이가 눈을 멀금히 뜨고 나를 바라보는게 아닌가?
나는 기겁을 할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