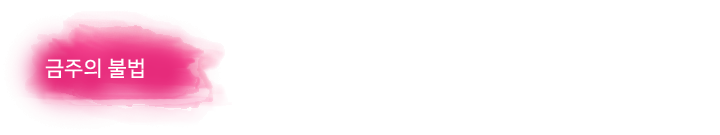천도재를 지낸 후에 허리병을 고치다.
무척이나 얌전하고 성실하게 우리 절에 몇년을 잘 나오시는 김보살님이계시다.
어느날인가 기도를 하다 아니 우리 절에서는 음력18일 지장재일이면 음식을 성심것장만하여
합동 천도재를 10년 가까이 하고 있었던 때이다.
그때 같이 천도재를 하다가 갑자기 김보살님 댁에 천도재를 지내야 할 것 같았다.
나는 000댁은 천도재를 한번해보시지요.
하고 이야기를 하였다.
하지만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엄두를 못내고 있던터였다.
천도재를 한번 지냄도 그리 쉬운일은 아닐것이다.
또 조상님들이 천도재를 받을 전생의 공덕이 있어야하며 공덕자의 마음이 하늘에 와 닿아야 하는것일게다.
살기도 힘들고 팍팍한데 얼굴도 모르는 조상님들을 위하여
천도재를 하기란 매우 큰 불심이 아니면 안 될것이다.
1년이 훨씬 지난 어느날이였다.
그날도 우리는 18일 지장천도재를 합동으로 지냈다.
김보살님은 그래도 매달 열심히 18일 지장재일은 열심히 참석을 하셨던 분이다.
김보살님은 기도를 마친 후에 “스님! 제가 이상한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조용히 여쭈어봤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하세요.”하였더니
“지장재일날 합동천도재를 눈을 꼭감고 지내고 있는데 지장청에 차려놓은 잿상에 왠 남자가 손을 뻩쳐 음식을 먹으려하니까! 다른 여러 사람들이 그 음식을 못먹게 손을 뿌리치고, 말리고 음식을 못 건드리게 하고있었습니다!”는 이야기이다.
꿈을 꾼것도 아니고 법당에서 천도재를 하다가 일어난 현상이니 필히 뭔가의 뜻이 있음이랴,
아마도 그런 현상을 보았다면 김보살님댁에 1년전 부터 마음먹은 천도재를 하여야 할것같았다.
조상님들이 너무나 말 없이 미루니까 아마도 김보살님게 지혜를 주셨으리라.
김보살님은 더욱 더 마음이 무거워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얼굴이 굳어 있었다.
천도식은 하고 싶고 돈은 없고 마음이 매우 불편하여서 그런지 웃음도 웃지 않으셨다.
남편이나 자식에개 돈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일것이다.
차일피일 미룰수밖에 없는 상황이였다.
어느날인가 그렇게 열심히 조용히 법회에 참석하시든 분이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한발짝도 못 움직이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고 결국에는 걸음까지 걸을 수가 없었다 한다.
열심히 가까운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는데 다 소용이 없고, 아파서 죽을것같다고 하였다.
우리는 간부 몇명과 문병을 갔다.
김보살님을 본순간 “이제는 할수없이 천도식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하고 강경하게 이야기해주었다.
우리가 방문하기 전날 김보살님은 꿈을 꾸었다고 하였다.
그 꿈 역시 천도식을 하여야 하는 꿈이 분명하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병이들면 무조건 병원을 간다.
물론 외과적이고 내과적인것은 필히 빠른 시일안에 병원을 내원하여야한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많은 이들 중 아무리 기술이 발달 하였다 하여도
씻은 듯 일어나는 이들이 있고,
같은 병에 같은 시술을 하여도 끝내 효과를 못보는 이들이 많은 것을 보아서 알것이다.
김보살님은 아무리 좋은 곳을 찾아 시술을 하여도 차도가 전여없는 안타가운 상황이였다.
일체의 모든 병들이 빨리 낳지를 않고, 병명을 알 수 없도록 어려운 처지라면
빨리 진단도 나오고, 좋은 약도 쓰게되고 좋은 의사를 만남도 이게 다 인력으로 안됨을 수없이 보아왔다.
소승은 수많은 시간과 공간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며
사람의 인력으로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에 지금 김보살님의 상태가 너무 안타까웠다.
그 뒤로 두달이 다 되어 우여곡절 끝에 천도재를 지냈다.
나는 진심으로 매달렸다.
“지장보살님이시여!
아무개가 여기 엎드려 지장보살님께 발원하오니 원컨데 조상님과 모든 유주무주의 원혼들께서 아무개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요!”
온 몸에 땀이 흠뻑적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였다.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기도의 묘미를 알게되는 법,
정말로 오랜시간을 벼르던 기도라 우리는 정말 열심히 천도재를 지낸듯 하였다.
그 뒤에 김보살님의 남편이 전화가 왔다.
“스님! 고맙습니다! 집사람이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해서 이제는 살겠습니다!”하고
기도를 힘들게 한 뒤의 공덕이라 기도 공덕은 절대 허사가 아님을 우리는 항상 느끼며 감사히 여긴다.
“지장보살! 지장보살!”